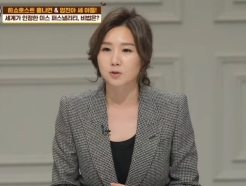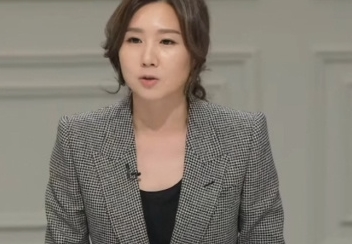|
서른 셋, 결혼도 했고 잘나가는 광고회사에 몸을 담고 있던 윤제균은 어느날 사표를 던졌다.
고된 일을 끝내고 새벽 3시까지 시나리오를 쓰다 다시 출근하던 날을 뒤로 하고 영화계에 투신했다. 그리고 '두사부일체' '색즉시공' '낭만자객' '1번가의 기적'을 연출했다. '간큰 가족'과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도 제작했다.
감독으로 제작자로 어느 정도 이름은 얻었지만 고생이 없을 수는 없었다. 충무로 적자가 아니라고 수근거림도 들었고 영화를 내놓을 때마다 혹평이 따랐다.
"'두사부일체'를 내놨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폭력적인 영화를 만드냐고 하더니 '색즉시공'을 개봉했을 때는 어떻게 '두사부일체'를 만든 감독이 저런 화장실 유머 영화를 만드냐고 하더라. '낭만자객' 때는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래도 '두사부일체'와 '색즉시공'은 흥행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코미디 영화에 자신감도 생겼다. 하지만 '낭만자객'은 그 모든 것을 앗아갔다.
"아무것도 모르고 영화계에 들어와서 만든 영화들이 300만, 400만을 훌쩍 넘더라. 그러다보니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것 같았다. 하늘이 심판을 내린 것 같았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낭만자객'이라고 애정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낭만자객' 이후 윤제균 감독은 작가로서 자신감을 잃었다. 썼다 지웠다한 한 작품만 여럿이요, 촬영에 들어가려다 엎은 영화만 5편이었다.
'낭만자객' 이후 '1번가의 기적'까지 3년이 걸렸다. '간 큰 가족'과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처럼 의미있는 작품을 제작했지만 감독으로서 메가폰을 잡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낭만자객' 이후 자신감을 잃었었다. 두려웠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성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1번가의 기적' 때는 그전에 나와 작품을 함께 한 스태프는 한 명도 함께 하지 않았다. 나태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거를 앞둔 달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인 '1번가의 기적'은 그렇게 탄생했다. 주연인 임창정과 하지원에게는 고마운 마음이 차고 넘쳤다. '두사부일체'와 '색즉시공',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에 출연한 임창정은 윤제균 감독의 페르소나이기도 하다.
"원래 완벽한 사람은 별로 안좋아한다"고 웃으며 말한 윤 감독은 "임창정은 순수함과 양아치같은 면이 공존하는 배우이다.좋은 작품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원에 대한 윤 감독의 애정 또한 두말할 나위 없이 크다.
아버지에게 챔피언 벨트를 가져다 주기 위해 권투를 하는 여자 배우로 하지원 외에 다른 배우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하지원 캐스팅을 주저하기도 했다.
"그러면 하지원 외에 다른 배우를 추천해보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무말도 못하더라."
촬영을 하다 코뼈를 다친 하지원에게 영화가 대박이 나면 치료비를 줄 것이냐고 묻자 "자기가 나보다 더 잘버는 데"라고 농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윤 감독에게 하지원이 완전히 신뢰를 줄 수 있는 배우이기 때문이다.
'1번가의 기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배우는 일동과 이순 역을 맡은 아역 박창익(11)과 박유선(8)이다. 두 아이가 토마토를 죽어라 얻어 맞는 장면은 '1번가의 기적'에서 가장 눈물을 쏟게 하는 장면이자 CF와 닮았다며 비판을 받는 장면이기도 하다.
"일동 역을 맡은 박창익이 가장 싫어하는 게 토마토였다. 10시간 동안 토마토에 맞는 장면을 촬영했는데 나중에 차라리 수박으로 던지라고 하더라."
윤제균 감독은 "두 아역 배우를 통해 한국 영화에 아역 연기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싶었다"고 말했다. "너무 괴롭혀서 나를 싫어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윤 감독은 두 아역 배우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1번가의 기적'에서 두 아역 배우가 웃음과 눈물을 책임졌고, 임창정과 하지원은 드라마를 책임졌기 때문이다.
"'색즉시공'과는 달리 임창정과 하지원의 멜로 라인은 생각하지 않았다. 두 사람에게서 진정성을 끌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색즉시공2'도 기획하고 다른 여러 영화들도 생각하고 올 해 윤제균 감독은 갈 길이 멀다. 그래도 발걸음은 가볍다.
"'1번가의 기적'은 내 영화 중 처음으로 개봉 때 '쓰레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은 작품이다. 진정성을 사람들이 인정해준 것 같다. 처음부터 흥행보다 진심을 담으려 했다. 현실이 아니라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다."
누구는 웃겼다 울리는 윤제균표 코미디를 싫어한다. 웃기려면 끝까지 웃겨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윤제균표 코미디는 미덕이 있다.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두사부일체'는 조폭을 학교로 보냈고, '색즉시공'은 미국식 화장실 유머를 한국화했다. '낭만자객'은 무협과 코믹, 귀신물을 한 데 섞었다.
윤제균 감독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다. '살인의 추억'보다 '괴물'에 더 감동을 받은 것은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의 다음 행보가 어떤 새로움일지, 기다림이 즐거워진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라인
라인
 웨이보
웨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