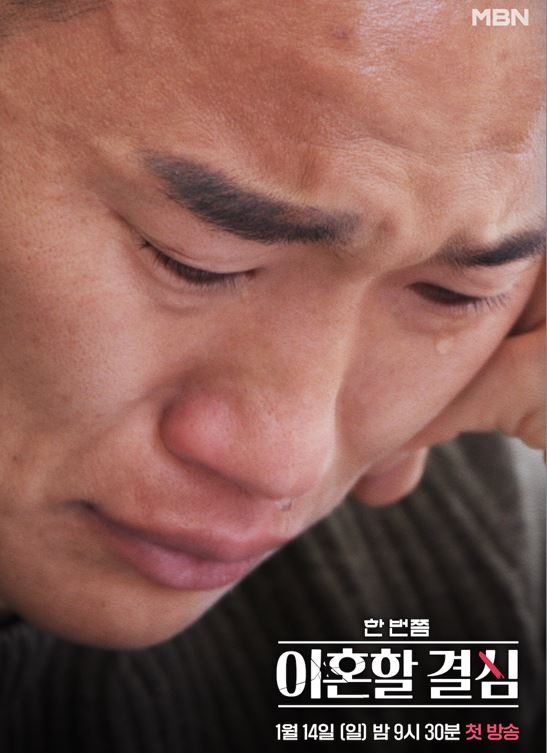|
영화 '마이애미 바이스'는 1980년대 인기를 끌었던 동명 TV시리즈를 제작했던 마이클 만 감독이 직접 리메이크한 액션물이다. 그러나 TV '마이애미 바이스'를 떠올리며 극장에 갔다가는 의외의 화면에 놀랄지도 모른다.
두 주인공은 소니(콜린 파렐 분)와 리코(제이미 폭스)라는 같은 이름으로 돌아왔지만 따가운 햇살이 부서지는 마이애미의 바닷가를 울긋불긋한 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던 멋쟁이들은 영화 속에 없다. 자연의 빛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색색의 인공조명으로 바뀌었고, 주인공의 알록달록 경쾌한 패션은 차분한 단색으로 얌전하게 변했다. 럭셔리하고도 몽환적인 스타일이 블록버스터 스케일, 주인공의 혼란스런 심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입이 쩍 벌어지는 영화의 '럭셔리'한 설정이다. 극 초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는 제보자를 추격하는 주인공 소니와 리코의 자동차는 수억원을 가볍게 호가하는 페라리 챌린지 카. 파란 불꽃을 뿜으며 오렌지색 불빛으로 뒤덮인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미끈한 경찰차에 입이 떡 벌어진다.
번쩍이는 슈퍼카가 경찰차로 쓰이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우리 영화 속 경찰차들이 떠오른다. 차종을 댈 수는 없으나 한눈에 들어오는 고급차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실제로 우리 경찰차들은 신형 소나타 차종이 주를 이룬다.
페라리 경찰차라니 말이 되나 싶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최고급 스포츠카 람보르기니가 경찰차로 쓰이기도 했다 하니 영화속 럭셔리 경찰차가 '오버'만은 아닌 듯하다. 두 주인공이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마약조직 소탕이란 임무를 맡고 남미와 미국을 자유자재로 누비는 설정이니 경찰차의 스케일마저 급이 다른 것이렸다.
럭셔리 스타일은 뒤로 가도 여전하다. 마이애미의 해변에서 맛보고픈 칵테일 이야기를 주고받던 공리와 콜린 파렐은 스피드 보트를 타고 망망대해를 가로질러 쿠바로 훌쩍 건너가고, 마약 운반책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새하얀 리어 제트기가 정글을 누빈다. 이른바 '간지'의 영화, '마이애미 바이스'에선 스케일과 스타일이 메시지를 전한다.
두 남녀를 태운 스피드보트가 시속 120km로 물길을 가르는 장면을 보라. 그저 먼 바다를 바라보는 주인공들과 달리는 보트를 잡았을 뿐인데 놀라움, 막막함, 긴장감 그리고 약간의 부러움이 섞인 탄성이 터진다. 마약 조직이 얼마나 방대한지, 그들 사이를 오가는 검은 돈이 얼마나 엄청난지가 함께 전해진다. 스타일 없이는 만들 수 없는 효과이자 특별한 감흥이다. 영화 한 편에 수천억원을 가볍게 쏟아붓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위력이 새삼 실감난다.
관습적이지 않은 카메라워크로 불길한 밤의 풍경을 생동감있게 잡아낸 마이클 만의 '마이애미 바이스'를 보고 있자면 '스타일이 모든 것을 말한다'는 어느 CF의 카피가 떠오른다. 영화가 스타일만으로 전부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스타일 없이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마이애미 바이스'는 보여준다.
 |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라인
라인
 웨이보
웨이보